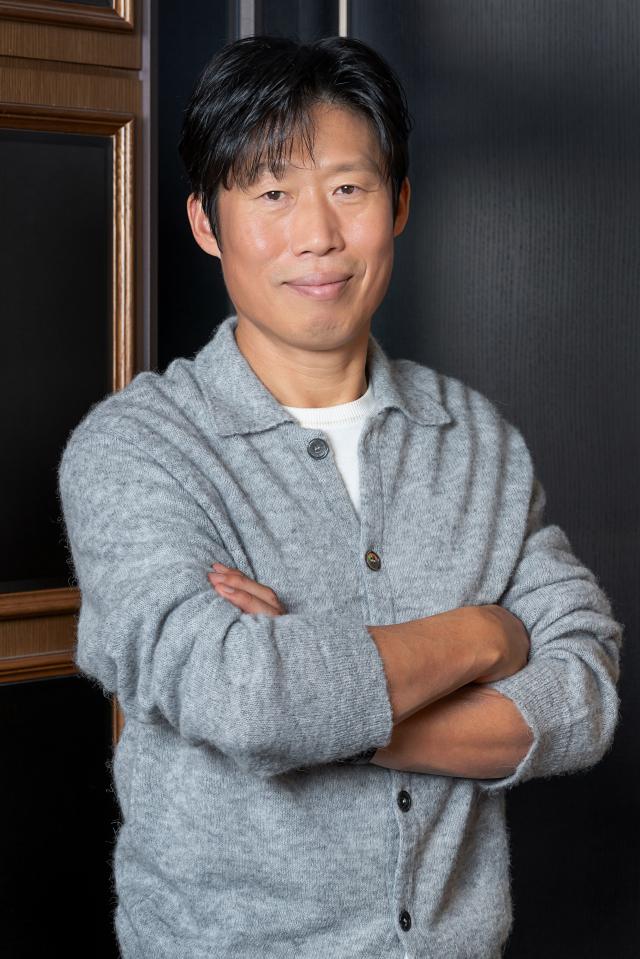
"영화를 처음 보고 많이 울었어요. 찍을 때도 슬펐는데, 완성본을 보니까 또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제 대사가 어찌나 많던지. 하하. '어우, 대사 하느라 고생했다' 싶었어요."
'왕의 남자', '올빼미' 등 사극 장르로 흥행 불패 기록을 내온 유해진인 만큼 이번 '왕과 사는 남자' 흥행에 대한 기대감도 높은 분위기다.
"잘 될 요소가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세대를 아우르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큰 감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이 보셔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요. 흥행은 솔직히 모르겠고, 그냥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달라진 건 잘 모르겠어요. 워낙 오랜 친구고, 작품을 같이 안 할 때도 문자 주고받고 그랬거든요. 큰 변화는 모르겠어요. (장항준 감독은) 진짜 늘 변함없는 사람이에요. 철이 안 든다고 해야 하나. 그게 장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고집 생기고 자존심 세우고 이른바 '꼰대'처럼 되기 쉬운데, 장항준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큰 장점 같고요."
실존 인물인 엄흥도를 연기하는 데에는 부담도 따랐다. 많은 정보가 기록되지 않은 만큼 관객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의 오류는 없을지 고민도 컸다.
"단종을 모셨던 이런 분이 있었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고, 관객분들도 자막 보면서 '아, 이런 분이 계셨구나' 하고 알게 되잖아요. 그런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달할지부터 고민이었어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니까 표현도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고요. 재미도 있어야 하니까, 그걸 어떻게 같이 가져갈지 계속 고민했어요. 그게 아니었으면 더 가볍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지만, 최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연기했습니다. 가상의 설정이긴 하지만 단종을 유배지로 모셔왔을 때부터 인간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게 될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스며들듯 가까워지는지가요.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부모가 자식을 보듯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모 같은 마음'이라고 정해놓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느껴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종 역을 맡은 박지훈에 대해서는 '후배 배우'로서의 시선도 솔직하게 전했다. 현장에서 주고받은 대화와, 함께 연기하며 느낀 에너지에 대해 유해진은 꽤 인상 깊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친구가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서로 의견도 많이 나눴어요. '아, 에너지가 좋은 친구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돌 그룹 출신이라는 건 알고 있었는데 에너지가 참 좋아서 놀랐어요. '아,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싶었죠. 저한테도 좋은 자극이 됐어요."
박지훈과의 호흡은 영화의 감정선을 떠받치는 중요한 축이었다. 특히 마지막 장면을 앞두고는 감정을 아끼기 위해 일부러 거리를 두는 선택까지 했다고 말했다.
"마지막 장면 찍기 전에는 일부러 지훈이를 피했어요. 미리 보면 못 할 것 같더라고요. 먼저 터져버릴 것 같아서요. 멀리서 지훈이가 '선배님' 하고 부르는데 제가 못 쳐다보겠더라고요. 대꾸도 안 하고 그냥 피했어요. 그 감정은 말로 형용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서로 대사를 하다 보면 눈을 보게 되잖아요. 그 눈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이야기 안에 들어와 있는지가 보여요. 슬픈 장면 찍을 때도 무슨 얘기 하다가 그 친구 눈을 보면 이미 젖어 있어요. 그러면 보는 사람도 확 오거든요. 반대로 제가 젖어 있으면 지훈이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요. '아, 이 친구가 지금 그 안에 있구나' 하고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어요. 없던 감정이 확 끓어오르기도 하고요. 그런 게 서로의 시너지라고 생각해요.
영화 말미, 단종의 시신이 물에 떠내려오는 장면 이후 이어지는 에필로그 장면은 유해진이 직접 아이디어를 냈다. 엄흥도의 시선을 보다 분명하게 정리해줄 수 있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수습할 때 과거로 돌아가는 장면 있잖아요. 단종이 물놀이하는 걸 슬프게 바라보는 신이요. 그건 제가 만들자고 한 신이에요. 찍다 보니까, 단종을 바라보는 게 부모의 시선 같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안 된 어린 자식 같은 느낌이랄까. 그래서 그런 장면을 하나 찍자고 했어요. 물놀이하면서 한양을 그리워할까, 부모를 그리워할까, 그런 걸 측은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점점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이 영화에서 전하고 싶은 것도 결국 그런 거 같아요. 너무 안 된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옆에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런 느낌이 남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최근 극장가의 분위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산업 전반이 위축된 흐름 속에서 한두 편의 흥행이 분위기를 단숨에 바꾸기엔 구조적인 부담도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묘'와 '야당'의 성공을 통해 관객과 다시 만났던 유해진은 이 흐름을 개인의 성과로만 받아들이기보다 영화판 전체를 바라보는 쪽에 가까운 시선을 보였다.
"제가 혼자 짊어지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뭐라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싫어요. 행복하던 시절도 있었죠. 지금도 솔직히 씁쓸하긴 한데 '언젠가'라는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 배부르자는 게 아니라 영화적인 것들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그러려면 우리 영화도 잘 돼야죠. 잘 된다는 게 꼭 큰 돈을 번다는 의미는 아니고 투자하신 분들이 손해 안 보게끔 그렇게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이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흐름이 계속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