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무디스가 지난달 27일 한국의 신용등급을 ‘A1’에서 ‘Aa3’로 상향조정한데 이어 피치사도 이달 6일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
특히 이번 S&P의 등급상향은 국제적으로 과거 외환위기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완벽히 탈피했다는 의미를 지닌다.
◇ 3개 신평사 모두 등급 상향은 한국 유일
S&P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1999년 11월11일 ‘BBB(안정적)’, 2001년 11월13일 ‘BBB+(안정적)’, 2002년 7월24일 ‘A-(안정적)’, 2005년 7월27일 ‘A(안정적)’으로 부여한 이후 7년동안 등급전망조차 한번도 조정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는 “무엇보다 S&P가 크게 우려해왔던 북한 관련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글로벌 경제위기상황 속에서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 경제를 높게 평가한 것이다”고 분석했다.
특히 유럽 재정위기 이후 주요국 신용등급이나 등급 전망이 줄줄이 떨어진 가운데 이뤄진 상향 조정이어서 이례적으로 평가된다.
작년부터 미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 신용등급이 잇따라 강등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 신용평가회사들이 A레벨 국가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은 한국뿐이다. 우리 경제의 위기 대응 능력과 안정성, 역동성을 평가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동일연도에 3개 신용평가사가 모두 등급을 상향조정한 것은 2002년 이후 최초이며 과거 총 2회에 불과하다.
◇ 외환위기 낙인효과 탈피..3개 신평사 기준 역대 최고등급 회복
이번 등급조정으로 한국은 3개 국제신평사 종합기준으로 볼 때 역대 최고등급을 회복했다.
2개 신평사 기준 ‘AA-’, 1개 신평사 기준 ‘A+’로 1997년 말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일어나기 직전인 지난 1996년 6월에서 1997년 10월까지 우리나라가 보유했던 최고 등급을 15년만에 회복한 것이다.
당시 S&P와 피치(Fitch) 등 2개 신평사로부터 ‘AA-’등급, 무디스로부터 ‘A1(A+)’ 등급을 부여받았다.
또한 국제적으로 과거 외환위기로 인한 ‘낙인효과’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의미를 지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시 양호한 펀더멘털에도 불구하고 주요 외신들은 한국경제에 대한 위기설을 지속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대외신인도 제고, 민간 해외차입비용 감소”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지면 국외 자금조달 비용 감소와 더불어 국가 브랜드 상승에 따른 수출 증가와 외국인 투자심리 호전 등 직간접적인 효과도 적잖게 뒤따른다.
신용등급 상향으로 기대되는 직접적인 효과는 대외 차입 여건이 좋아진다는 점이다. 우리의 외화표시 채무 규모가 2700억 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연 3억∼4억 달러의 이자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재정부는 신용등급이 1단계 올라갈 때 가산금리 하락에 따른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해외자금 조달 비용 절감효과가 연간 약 4억달러(약 4500억원)에 달한다는 추산을 내놓기도 했다.
실제로 최근 무디스와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 이후 산업은행(10년물 155bp), 농협(5년물 165bp), 한국수력원자력(10년물 150bp) 등은 매우 낮은 가산금리로 채권을 발행했다.
신용위험도를 보여주는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도 추가 하락했다.
특히 우리나라 CDS프리미엄은 무디스와 피치의 등급상향에 따라 지난달 24일 107bp에서 이달 13일 74bp로 떨어져 주요 아시아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큰 폭의 하락을 보였다. 앞서 5일에는 한국이 99bp로 사상 처음 중국(100bp)을 앞질렀다.
해외투자자들이 한국물에 대한 투자심리 개선에 따른 국내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등의 투자촉진 효과도 예상된다.
이밖에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 등의 신용등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S&P는 이날 국가신용등급 발표와 함께 수출입은행, 주택금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정책금융공사의 등급도 상향조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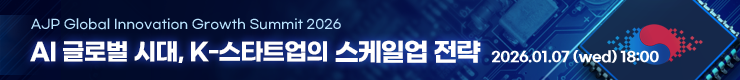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