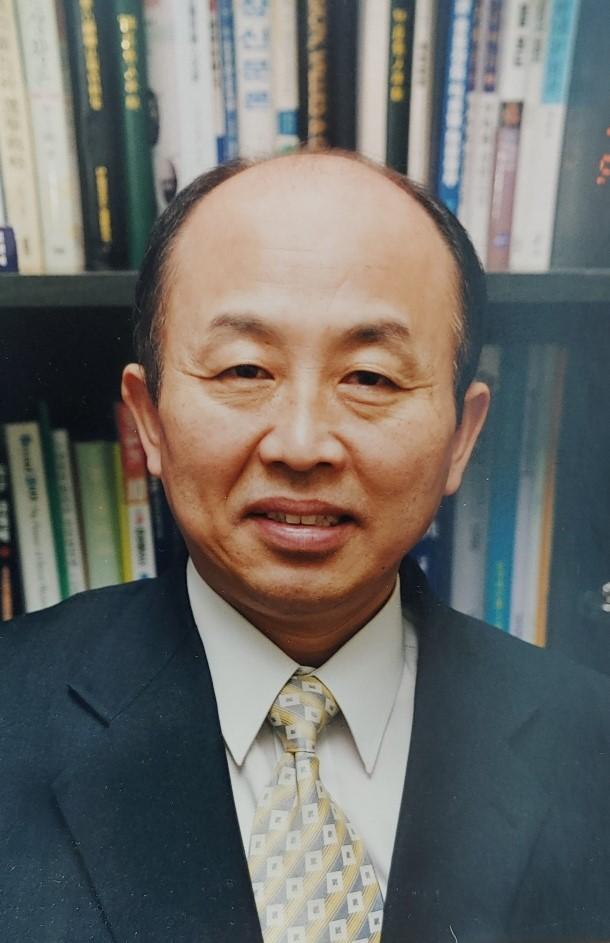
비상 통치 논란과 ‘계엄령’의 함정
정치의 본질은 ‘힘의 충돌’과 ‘심리 전쟁’이다.『손자병법(孫子兵法)』은 “상병벌모(上兵伐謀), 기차벌교(其次伐交), 기차벌병(其次伐兵), 기하공성(其下攻城)”이라 했다. 최고의 전략은 싸우기 전에 상대의 계책을 꺾는 것이며, 정면충돌은 최하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전술 중 하나가 상대 장수를 도발해 분노로 이성을 잃게 한 뒤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격장지계’(激將之計) 계략‘이다. 흔히 성격이 급한 적장을 상대로 상대 장수의 감정을 결정적으로 자극시켜 의도하는 방향으로 이끄는 계책인데 윤석열이 이재명의 격장지계에 걸려들었다.
윤석열 정권 몰락의 결정적 계기는 ‘계엄령’ 논란이었다. 야당은 격장지계인 도발 전략으로 윤석열의 분노를 촉발시켰다. 윤석열은 민주당의 감사원장 등 20여 차례 탄핵 공세와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에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누구도 예상 못한 계엄령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정면충돌을 택한 윤은 상대가 도발로 유도한 ‘정치적 함정’에 스스로 뛰어든 격장지계의 전형적 사례였다.
윤석열의 비상계엄이라는 감정적 강경 대응은 정치의 본질—적과 동지를 구별하고 감정을 절제하는 기술—을 간과, 오히려 지지율 급락과 정치적 고립을 자초했다.
『한비자(韓非子)』는 “용기(勇氣)만 있고 계책(計策)이 없는 자는 반드시 사로잡힌다(勇而無謀者(용이무모자), 必爲人擒(필위인금)”며 “장노이불절(將怒而不節), 즉병란이국위(則兵亂而國危)” 즉 “장수가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면 군대가 혼란해지고 나라가 위태로워진다.”고 경고한다.
이를 예견하듯 “힘으로만 이긴 자는 힘이 다하면 반드시 패한다(以力勝者, 力盡則敗:이력승자, 역진즉패)”(『자치통감(資治通鑑)』)고 기록했다. 그의 통치는 힘에 의존했으나, 민심과 조직 장악이라는 근본적 ‘세(勢)’를 놓쳤다. 결론은 ‘권력은 세(勢)로 다스린다.’로 요약된다.
역사적으로 인내(忍耐)의 대표적 사례는 삼국지의 사마의(司馬懿)다. 삼국지에서 제갈량(諸葛亮)은 위나라 정벌을 위해 사마의가 지키는 성을 공격했으나, 사마의는 굳게 성문을 닫고 수비를 이어갔다. 조급해진 제갈량은 ‘격장지계’를 써서 사마의에게 여자 옷을 보내 모욕했다. 보통 장수라면 분노로 성문을 열고 나오겠지만, 사마의는 이를 간파하고 치욕을 참았다.
『자치통감』은 사마의를 “인욕이대(忍辱以待)”, ‘모욕을 참으며 때를 기다린 자’라 평했다. 승패는 전장에서의 무력보다 인내와 심리전에서 갈렸다. 사마의는 제갈량의 도발에 맞선 인내와 후흑(厚黑)의 지구전(持久戰)으로 승리했고, 조조(曹操) 밑에서 위나라 권력을 장악한 그는 겉은 충신처럼 꾸미되 속에 야심을 감췄다.
《한비자(韓非子)》의 “겉은 관대한 척했으나, 속은 엄격함(外寬而內嚴)”을 실천하며 조조 3대 조정에서 실권을 장악했고, 훗날 그의 손자 사마염(司馬炎)이 진(晉)을 세워 삼국을 통일 했다. 역사는 이를 ‘인내로 적을 제압(以忍制敵)하고 후흑으로 공을 이룸(以厚黑致功)’의 전형으로 본다.
진(晉)나라 중시조가 된 사마의는 ‘작은 분노’를 참으며 장기적으로 ‘창업 개국’의 포석을 깔았다. 그의 처세는 “이퇴위진(以退爲進)”, 즉 한 걸음 물러서 두 걸음 나아가는 제왕술의 완성형이었다. 이재명도 정면충돌 대신 ‘기다림의 매복전(埋伏戰)’을 택했다.
첫째, 윤석열의 자충수를 기다려『손자병법』의 “불전이굴인지병(不戰而屈人之兵)”을 현대 정치에 적용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길을 추구했다.
둘째, 민생 이슈로 여론을 장악, 정치 공방 대신 물가·경제·일자리 등 민생에 집중,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다.
셋째, 법적 위기를 정치적 무기로 전환,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 ‘피해자 이미지’프레임을 부각시켜 지지층을 결집했다. 이는 ‘격장지계’로 상대의 분노를 유도하고, 동시에 민생과 여론을 묶어 전략적 우위를 점하는 정치술이었다.
윤석열의 패착이 된 자충수를 관찰하면 ‘인내가 권력을 지킨다’라는 말이 실감 난다. 윤은 권력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중용(中庸)』은 “치우치지 않음이 중이며, 변치 않음이 용이다(不偏之謂中, 不易之謂庸)”라 했다. 여기서 ‘중(中)’은 단순히 중간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최적(最適)의 균형점을 찾는 ‘시중(時中)’의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나 비상 통치 논란은 정치적 균형을 상실한 ‘치우침’이었다. ‘시중’을 잃은 강권의 자해(自害) 행위였다. 자신의 통치 능력을 과신하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권력은 결국 자기파괴의 길을 걷게 된다.
정치는 단순한 도덕의 영역이 아니다. 슈미트(Carl Schmitt)가 말했듯, 정치의 본질은 ‘동지와 적을 구별하는 행위’이며, ‘위기 속 결단이 주권자의 본질’이다.
여기에 제왕학은 한 가지를 덧붙인다.『정관정요(貞觀政要)』는 “소분불인, 즉란대모(小忿不忍, 則亂大謀)” 즉 “작은 분노를 참지 못하면 큰 계책을 어지럽힌다.”고 지적한다. 또 “치국선치리(治國先治吏)”라 했다. 사람과 조직을 다스리지 못하면 국정(國政)은 무너진다.
지도자는 인내와 절제로 감정을 제어하고, 심리전을 꿰뚫어야 한다. 윤의 분노는 몰락을 불렀고, 이의 인내는 승리를 가져왔다. 병법과 제왕학은 “지도자는 감정으로 망하고, 인내로 권력을 지킨다.”고 한목소리로 경고한다.
역사 속 난세의 지도자들과의 비교
역사 속 위대한 지도자들은 난세 속에서 역경을 극복하며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위기 상황에서 발휘한 인재 활용 능력과 충언(忠言) 수용의 자세에 있었다.
조조는 ‘유교적 명분’과 ‘법가적 실리’를 결합해 혼란한 시대를 제어했다. 그는 인재를 등용할 때 가문이나 혈통이 아닌 오직 능력을 기준으로 삼았으며, 자신에게 비판적 목소리를 낸 순욱(荀彧) 같은 인물도 중용했다. 이는 인재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활용하는 유연한 리더십을 보여준다.
징기스칸은 정복 군주였지만, 정복 이후에는 문치(文治)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그는 거란 출신 지식인 야율초재(耶律楚材)를 등용하여 몽골 제국의 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과도한 약탈을 막아 민심을 안정시켰다. 이는 무력만으로는 제국을 유지할 수 없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것이다.
당태종(唐太宗)은 신하 위징(魏徵)의 직언을 수용, 쓴소리를 '인간 거울'로 삼아 자신의 허물을 고치며 중국 최대의 태평성대(太平聖代)라는 '정관(貞觀)의 치(治)'를 열었다. 비록 충언이 불편하고 모욕적일지라도, 이를 경청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국가의 번영을 이끌었다.
현대 정치사의 사례에서도 이러한 경향은 반복된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의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은 전시(戰時) 내각을 구성하며 정적을 포용했고, 끊임없이 정보를 수집, 분석하며 전쟁을 지휘했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Abraham Lincoln)도 남북전쟁 당시 자신과 정치적으로 반대되는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여 '경쟁팀의 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모두 위기 속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고 통합하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반면 윤은 비판을 ‘적대(敵對)’로 간주했고, 정책 결정은 폐쇄적인 소수 그룹에 의해 이루어졌다. “겸청하면 밝다(兼聽則明)”를 외면, 정책 오류(誤謬)는 누적되었고, 국민적 불신을 초래했다.
제왕학이 주는 현대 정치의 세 가지 경고
윤 사례는 제왕학이 과거 유물이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 리더십에 대한 강력한 경고임을 보여준다.
첫째, 인재와 충언의 균형이다.『정관정요』는 명확하게 “두루 들으면 밝고, 한쪽만 들으면 어둡다(兼聽則明, 偏聽則暗)”고 했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충신과 충성심으로 자신을 지지하는 측근을 모두 포용하고 균형을 맞춰야 한다. 이는 다양한 관점과 정보를 통해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기 위함이다. 윤 정권의 인사 구조는 이 원칙을 거스른 결과였다. 폐쇄적 인사는 정보 편향을 낳았고,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이어졌다.
둘째, 과단성과 절제의 동시 필요성이다. ‘난세의 지도자’는 결단력과 함께 절제를 동시에 지녀야 한다.『중용』의 ‘時中’은 상황에 따른 균형 감각을 뜻한다. 이는 '적당히'가 아니라, 급진적 개혁과 신중한 안정 사이에서 최적 지점을 찾아내는 지혜를 의미한다. 지도자는 과감한 결단이 독선이나 무모함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자신을 절제해야 한다. 계엄령 논란은 ‘과단성’으로 포장된 무모함이었고, 절제가 없는 강권은 민심을 떠나게 했다. 정치적 절제가 부족한 리더십은 결국 자기 파멸을 초래한다.
셋째, 덕화(德化)와 신뢰 회복이다.『한비자』는 “현명한 군주의 길은 상벌을 반드시 믿게 하는 것이다(明主之道, 賞罰必信)”라 했다. 일관성 있는 상벌과 국민과의 신뢰가 통치의 기본이다. 법치주의는 중요하지만, 법률만으로는 통치를 유지할 수 없다. 리더의 도덕적 권위와 국민적 신뢰가 무너질 때, 아무리 강력한 법적 권한도 무용지물이 된다. 윤은 여러 차례 논란에 휩싸이며 신뢰를 잃었고, 법적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되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지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통치 자산이다.
윤석열 ‘거울 없는 권력’의 불가피한 종말
윤의 몰락은 제왕학의 ‘거울’이 사라진 결과였다.『사기』는 “사람을 거울로 삼으면 득실을 알 수 있다(以人為鑑, 可以知得失)”고 했다. ‘사람’은 단순히 신하(臣下)를 넘어, 국민 전체를 의미한다. 현대 민주정에서 지도자는 국민을 거울로 삼아 자신의 허물을 살펴야 한다.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고통에 공감하며, 기대를 반영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인간 거울'을 사용하는 것이다. 지도자가 고전의 거울은 물론, 국민이라는 거울마저 외면한다면, 권력은 스스로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제왕학은 더 이상 봉건 시대 군주만의 학문이 아니다. 오늘날 정치 리더십의 위기와 지도자의 몰락은, 고전이 던지는 경고를 외면한 ‘거울 없는 권력’의 숙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윤석열 사례는 그 경고가 현실에서 어떻게 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교본이 되었다.
이 시대의 지도자들은 과거의 역사를 되새기며, 자신을 성찰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권력을 유지하고 국가를 번영시키는 유일한 길이다.
제왕학은 “권력은 냉혹하며, 이를 잊는 자는 권력에 삼켜진다.” 결론짓는다. 높이 나는 용은 바람을 의심해야 하고, 땅에 붙은 잡초는 뿌리로부터 강해야 한다. 강해야 오래가고, 분별할수록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의 세계에서 인내와 분별은 권력을 지키는 최후의 덕목이다
박종렬 필자 주요 이력
▷고려대 철학과 ▷중앙대 정치학 박사 ▷동아방송·신동아 기자 ▷EBS 이사 ▷연합통신 이사 ▷언론중재위원 ▷가천대 신방과 명예교수 ▷가천대 CEO아카데미원장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