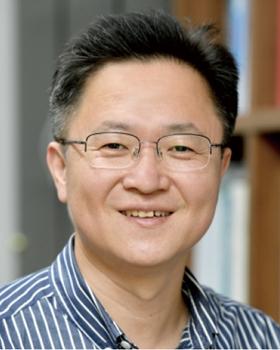
기후변화가 피부로 느껴지는 한 해다. 여름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전히 날씨는 덥고, 며칠 전에는 집중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다.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 불과 1km만 옆으로 가도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 경우가 있다. 이어지는 폭우는 많은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를 남겼다. 이처럼 기후와 날씨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고 있다.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상 고온 등 기후변화가 산업재해 증가로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산업재해 사고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내에서도 높은 수준이다. 물론 OECD 통계는 기준이 제각각이다. 공무원·군인 포함 여부, 자영업자 포함 여부, 재해 후 1년 내 사망자 포함 여부, 출퇴근 재해 포함 여부, 질병 포함 여부 등이 달라 국가 간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다. 그러나 추이를 통해 흐름은 확인할 수 있다. 국내만 봐도 산재 사망률은 2003년 1만 명당 2.55명에서 2014년 1.08명으로 줄었고, 2024년에는 0.98명까지 낮아졌다. 하지만 산재 적용 근로자 수가 늘면서 사망자 수 자체는 2018년 이후 줄지 않고 2000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산재 통계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사고가 더 많다. 기인물별로는 건축·구조물 및 표면, 운반·인양 설비·기계, 부품·부속물·재료 순으로 집계됐다. 사망사고 재해유형은 떨어짐, 끼임, 교통사고, 부딪힘, 화재·폭발·파열 등이 주를 이룬다.
대책은 분명하다. 기업은 단기·비숙련 인력 의존도를 줄이고 숙련공을 중심으로 고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매일 다국어 안전점검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전날 과음으로 숙취가 있는 인력은 작업에서 반드시 배제해야 한다. 이 경우 당장 인력난이 생길 수 있으나, 사망사고로 인한 기업 손실이 훨씬 크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 최저가 낙찰제를 손봐야 한다. 하청에 하청을 거듭하는 구조에서 낙찰을 받은 업체는 비용을 제거하고 남는 수익이 크지 않다 보니 안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어렵다. 종합평가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안전관리 능력과 인력 숙련도를 함께 평가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해외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 영국의 CDM 제도(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Regulation)는 건설의 경우 발주 단계부터 안전관리 계획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 법적 책임을 지게 한다. 호주의 화이트카드 제도는 현장 인력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받아야만 입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제도들은 한국의 현실에도 시사점이 크다.
산재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발주자가 정부일 수도, 기업이나 가정일 수도 있다. 예방은 제도와 사회 구조 개선에서 비롯돼야 한다.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 체계를 보장하고, 숙련 인력 확보 시스템을 마련하며, 발주 단계부터 안전을 포함해야 한다.
사람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정부도, 기업도 모두 사람이 이끌어가는 것이다. 안전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라는 인식이 자리 잡아야 한다. 산업현장에서 산재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하고, 사회적 분위기와 제도도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