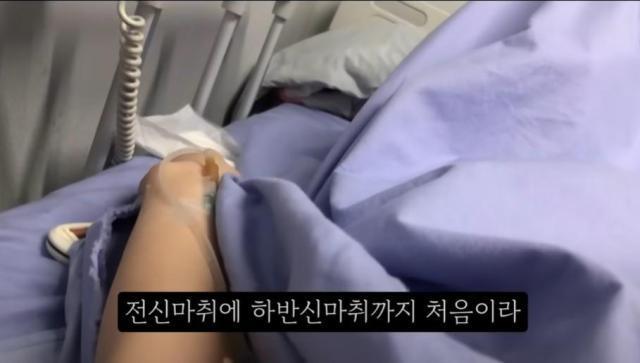
36주 차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병원장과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실관계 이상의 법적·사회적 함의를 던진다. 2019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로 판단한 뒤 국회가 입법을 방치하면서 ‘낙태 처벌 공백’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신 후기 태아를 둘러싼 형사처벌의 경계와 법리적 의미가 법정에서 새롭게 규명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살인’인가. ‘낙태’인가.
임신 36주 차 산모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태아를 냉동고에 넣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윤모(80)씨와 대학병원 의사 심모(60)씨가 18일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산모 권모(20대)씨와 브로커 2명도 불구속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권씨가 유튜브에 낙태 관련 영상을 올리며 ‘살인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된 뒤 보건복지부 진정으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두 의료진을 살인과 허위진단서 작성 등으로, 권씨를 낙태 의뢰 공범으로 기소했다.
핵심은 ‘살인’이냐 ‘낙태’냐다. 이는 의사의 직접 살인 행위와 산모의 낙태 의뢰를 어디까지 구별할지, 형사 책임의 경계가 무엇인지가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임을 보여준다. 권씨 측은 “임신 중절 의뢰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인 공모는 없었다”며 주관적 고의 부인을 시도했다. 수술방법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태아가 36주에 달해 독자적 생존이 가능하므로 단순 낙태가 아니라 출산아 살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피고인들은 임신 36주 권씨를 제왕절개로 출산시킨 뒤 태어난 태아를 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어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의료진은 진료기록에 ‘사산’이라고 허위 기재했고, 권씨가 낙태 의뢰를 했다는 점도 확인됐다. 문제는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낙태에 해당하는지다.
낙태죄의 입법 공백
헌법재판소는 2019년 형법상 낙태죄 조항(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임신 전 기간을 막론하고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도 반한다는 이유였다. 다만 태아의 생명권 보호도 중요한 가치라는 점에서 헌재는 ‘임신 주차별 단계적 허용 기준’을 입법으로 정하도록 국회에 요구했지만, 기한 내 후속 입법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써 의사 낙태죄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고, 낙태 수술의 형사처벌 근거가 사라졌다.
문제는 임신 후기다. 임신 24주 이후 태아는 독자적 생존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다수 국가에서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우리 법은 이를 규율할 장치가 없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한 배경은 바로 이 입법 공백 때문이다. 검찰은 “생존 가능성 있는 태아를 살해한 경우 살인죄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로 기소했다.
태아가 출산 절차를 거쳐 생명을 갖게 된 순간 이후에는 낙태가 아닌 살인의 영역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임신 후기(24주 이후) 중절 수술을 둘러싼 처벌 규정이 불명확해졌고, 이는 법원이 태아의 법적 지위와 산모 자기결정권의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의미를 가진다.
임신 후기 낙태 양형 기준의 부재
재판부는 “구속 피고인이 있는 만큼 지연 없이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며 오는 11월 13일 권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과 양형증인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음 기일에 재판을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혀, 사실상 이번 사건에 대한 판단이 연내 확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태아 생명권 보호를 강조하며 살인죄 적용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피고인 측은 살인의 고의 부인을 통해 양형 경감을 시도하고 있다.
현행 양형기준상 ‘살인’ 범주에 임신 후기 낙태는 포함돼 있지 않다. 과거 임신 후기 낙태 사건은 대부분 업무상 촉탁낙태죄로 처벌됐다. 판례상 22~24주 이후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지면 ‘낙태가 아닌 살인’에 해당한다는 해석이 일부 제시됐다. 그러나 헌재의 헌법불합치 이후 적용 조항이 사라지면서 최근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 사체 유기 등으로 한정돼 왔다. 이번처럼 36주 태아 사망을 둘러싼 기소는 극히 이례적이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낙태죄 공백 상황에서 태아 살해 사건을 어떻게 법적으로 평가할지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며 재판의 향방에 주목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