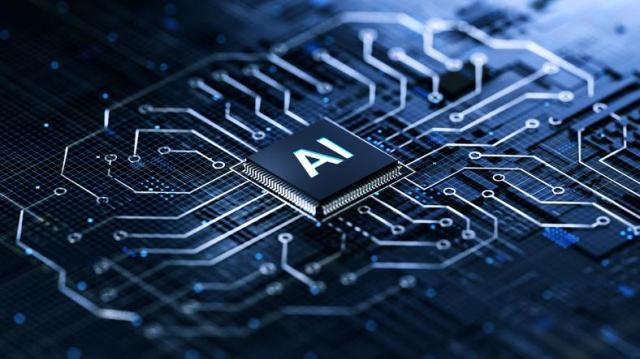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AI 확산과 생산성 효과'에 따르면 AI를 활용한 근로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은 3.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1.5시간 단축된 셈이다.
특히 경력이 짧은 근로자일수록 시간 단축 효과가 커지는 '숙련도 평준화 효과'가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의 AI 활용률(69.2%)과 노동시간 감소율(2.8%)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은은 AI를 자주 사용하는 직군일수록 노동시간 감소 효과가 크며 이는 생산성 향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AI 활용 경험이 축적되고 AI 기술이 고도화되면 생산성 향상 효과는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I기술 발전은 디지털 영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로봇 등 물리적 AI도 업무 현장에 확대되고 있다. 국내 근로자 중 15%가 업무 현장에서 로봇과 협업하고 있으며, 이중 11%는 자율성을 갖춘 로봇과 협업하고 있다.
앞으로 현재 비협업 근로자의 16.3%가 추가로 로봇과 협업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면서 전체 근로자의 약 27%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기술 발전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나라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이다. 실제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OECD 평균(1742시간)보다 132시간 더 길다. 이는 주 40시간 기준으로 약 3주 이상 더 일하는 셈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1859시간이었다.
이에 정부는 이같은 장시간 노동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주 4.5일제 등 근로시간 단축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며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사용자 단체, 정부(노사정)가 참여하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 키를 잡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 추진단은 △포괄임금제 금지와 연차휴가 활성화 등 법·제도 개선 △노동생산성 향상 △고용률 제고 △일·가정 양립 지원 방안 등을 집중 검토한다. 특히 향후 3개월간 워킹그룹을 운영해 주 4.5일제 도입, 생산성 향상, 제도 개선 과제를 심층 논의하고, 연말에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공개 토론회, 간담회, 현장 방문 등을 통해 노동자와 기업,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