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정례 시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존재의 배면에서 수줍게 숨어 있는 시가 좋다. 발갛게 숯이 되어 타고 있지만 꼿꼿이 서서 무너지지 않는 시가 좋다. 문 없는 문 안에 있는 시를 쓰고 싶었다. 어떻게 들어갔을까 어디로 나갈 수 있을까, 근원을 질문하는 시, 마음과 육신이 만나는 교량 위에서 김수영의 시에서처럼 늙음과 젊음이 만나고, 미움을 사랑으로 포용하는 시를 쓰고 싶었다.”
세상에 마음을 잇는 시를 남긴 최정례 시인이 지난 1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최 시인은 1955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현대시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시집 ‘내 귓속의 장대나무숲’·‘햇빛 속에 호랑이’·‘붉은 밭’·‘레바논 감정’·‘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인데’·‘개천은 용의 홈타운’ 등을 썼다. 최 시인은 2015년 미당문학상을 비롯해 현대문학상(2007년)·백석문학상(2012년)·오장환문학상(2015년)을 받았다.
암 투병 중이던 지난해 11월에 낸 일곱 번째 시집 ‘빛그물’은 유작이 됐다. 병마도 시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다. 고인은 병원 무균실에서 교정을 봤다. 고통은 시로 승화시켰다. “극약 처분의 낭떠러지를/기어올라야 하는”(‘1㎎의 진통제’ 중)
낭떠러지에서도 시인은 ‘시’를 통해 희망을 노래했다. 고인은 ‘빛그물’ 편집자와의 대화에서 “처음엔 통증 피하느라 정신없다가, 이제는 먹는 것과 자는 것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한식구가 되어 뒤늦게 학교에 들어온 것 같다”며 “그동안 전혀 몰랐던 사람들과 다양하게 만나게 되고 그들이 다 자기 생명의 벼랑에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배울 것이 많다. 사과 한쪽도 나눠 먹고 서로 아픈 것을 위로하며 지내니 이젠 병원이 집이고 학교 같다”고 말했다.
최 시인은 산문과 시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산문시’를 썼다.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는 복잡다단한 우리의 현대 생활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게 시인의 생각이었다. 최 시인은 “형식적인 파괴 혹은 형식적인 발견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제 자신을 좀더 들들 볶으면서 대답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인은 시와 사랑으로 촘촘히 엮은 아름다운 ‘빛그물’을 남겼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8일 오전이다.
“계획은 늘 ‘시를 잘 쓰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늘어날수록 시를 잘 쓰는 게 가능한 것인지 어렵기만 해요. 시를 통해서건 그 무엇을 통해서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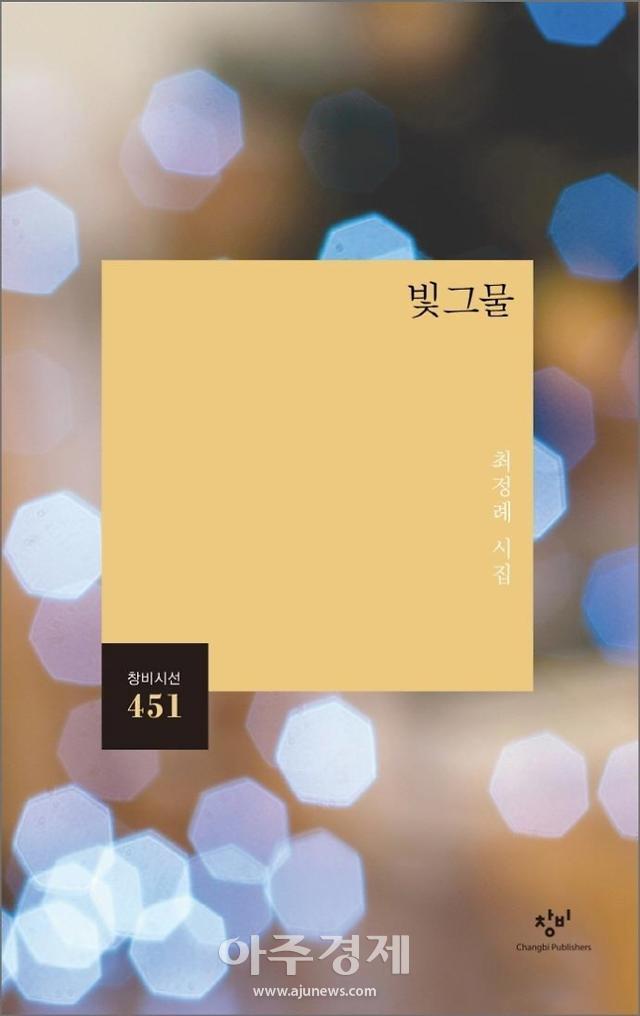
세상에 마음을 잇는 시를 남긴 최정례 시인이 지난 16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66세.
최 시인은 1955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고려대 국문과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90년 ‘현대시학’을 통해 작품 활동을 시작한 고인은 시집 ‘내 귓속의 장대나무숲’·‘햇빛 속에 호랑이’·‘붉은 밭’·‘레바논 감정’·‘캥거루는 캥거루고 나는 나인데’·‘개천은 용의 홈타운’ 등을 썼다. 최 시인은 2015년 미당문학상을 비롯해 현대문학상(2007년)·백석문학상(2012년)·오장환문학상(2015년)을 받았다.
암 투병 중이던 지난해 11월에 낸 일곱 번째 시집 ‘빛그물’은 유작이 됐다. 병마도 시에 대한 열정을 꺾지 못했다. 고인은 병원 무균실에서 교정을 봤다. 고통은 시로 승화시켰다. “극약 처분의 낭떠러지를/기어올라야 하는”(‘1㎎의 진통제’ 중)
최 시인은 산문과 시의 경계를 자유롭게 오가는 ‘산문시’를 썼다. 전통적인 시 형식으로는 복잡다단한 우리의 현대 생활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게 시인의 생각이었다. 최 시인은 “형식적인 파괴 혹은 형식적인 발견을 위해 고군분투하면서 제 자신을 좀더 들들 볶으면서 대답해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고인은 시와 사랑으로 촘촘히 엮은 아름다운 ‘빛그물’을 남겼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발인은 18일 오전이다.
“계획은 늘 ‘시를 잘 쓰자’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자’이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늘어날수록 시를 잘 쓰는 게 가능한 것인지 어렵기만 해요. 시를 통해서건 그 무엇을 통해서건 사람을 사랑하는 게 제가 해야 할 일인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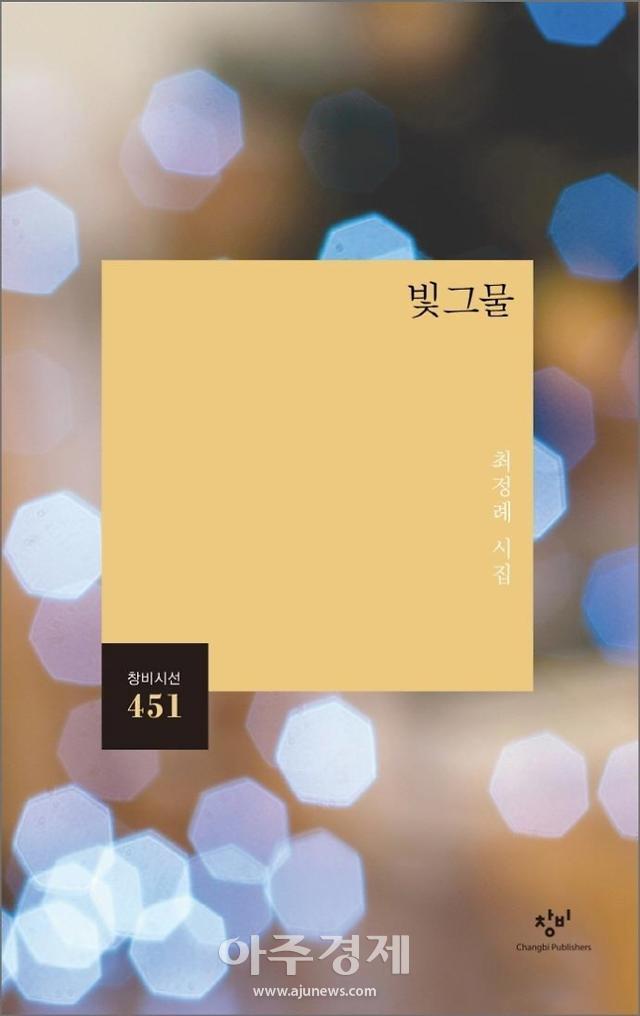
등단 30주년을 맞이해 2020년 발간한 ‘빛그물’ [사진=창비 제공]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