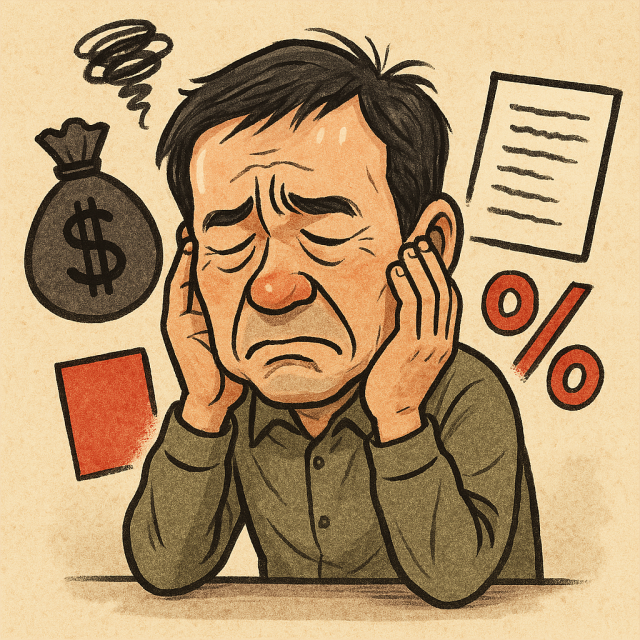
정부가 금리 규제와 정책자금 공급으로 불법 사금융을 막고자 하지만, 정작 제도권 문턱은 여전히 높은 게 현실이다. 이로 인해 서민들이 고금리 사채에 내몰리는 구조는 되풀이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장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금리 설계 없이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 피해 신고 건수는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 △2024년 1만5397건 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등록 대부업체 수는 2020년 이후 20% 이상 줄어들었다. 제도권의 마지막 보루였던 대부업마저 무너지자, 서민들이 결국 불법 사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 강도도 심각하다.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발표한 '2024년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실적'에 따르면, 피해자 593명의 연평균 이자율은 503%에 달했으며, 평균 대출금액은 1100만원, 평균 거래 기간은 49일이었다. 법정 최고금리(연 20%)를 한참 넘는 고리 대금으로, 상환 부담이 극심한 실정이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도적 대응도 강화하고 나서지만 정작 금융 소외 계층의 체감도는 낮은 편이다. 일부 상품의 금리는 높고, 신청 요건도 까다롭다. 현재 대표적인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햇살론15'는 금리가 연 15.9% 수준이다. 심지어 지난해 햇살론 신청자 중 40%는 소득이나 신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대출이 거절됐다.
정치권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15%로 낮추는 법안까지 마련했으나, 전문가들은 이는 해법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시장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도 최고금리는 20%로 묶여 있다 보니, 금융사는 수익성이 낮은 저신용자 대출을 꺼려 결국 이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밀려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구조를 개선하려면 시장금리에 따라 최고금리도 함께 조정되는 '탄력적 금리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법정 최고금리는 시장금리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조달비용이 올라가면 그에 맞춰 최고금리도 유연하게 반영돼야 제도권 금융에서 저신용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연 100%를 초과하는 이자를 받는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돼 원금과 이자 전액이 무효화된다. 금리 수준만으로 계약 전체를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 관련 법령상 처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