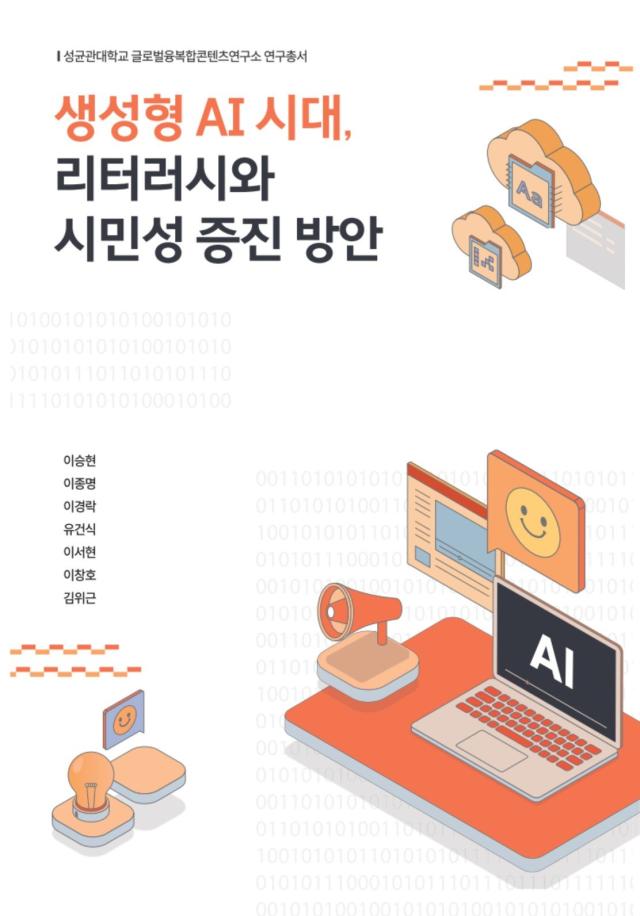
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는 최근 급변하는 인공지능 기술 환경 속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시민 리터러시의 방향을 제시한 ‘생성형 AI 시대, 리터러시와 시민성 증진 방안’을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과 그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변화가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성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응하는지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해법을 제시한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장은 언론, 방송, 정책, 윤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총서는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교수의 ‘생성형 AI 시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미디어 소통과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상을 짚는다.
이 교수는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것의 활용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는 강화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며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기술의 숙련 외에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적 윤리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시민 리터러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종명 성균관대 글로벌융복합콘텐츠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술의 활용과 시민성 증진 및 저해’라는 주제로 생성형 AI 기술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서 반(反)시민성을 유발하는 현상과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의 윤리적 취약성을 진단한다.
특히 방송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논의가 눈에 띈다. 이경락 YTN 저널리즘연구소장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사례와 저널리즘적 쟁점을 제시했으며,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을 역임한 유건식 PD는 드라마, 예능, 공연 등 제작 현장에서 마주한 기술적 문제와 윤리적 갈등을 설명했다. 이서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조직 내 방송 제작자들의 반응과 수용 태도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의 실질적 문제를 들여다봤다.
생성형 AI 기술이 시민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터러시 교육과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윤리적 논의와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총서를 기획한 이종명 선임연구원은 “이번 총서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기술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사람 중심의 AI 활용’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생성형 AI 기술의 부상과 그로 인한 커뮤니케이션 생태계의 변화가 민주사회에서 요구하는 시민성과 어떻게 충돌하거나 조응하는지를 다각도로 진단하고, 그에 대한 교육적·정책적 해법을 제시한다.
총 7개의 장으로 구성했으며, 각 장은 언론, 방송, 정책, 윤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총서는 이승현 동서울대 디지털방송콘텐츠학과 교수의 ‘생성형 AI 시대 커뮤니케이션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미디어 소통과 방송 제작에 미치는 영향을 소개하며 디지털 시대의 변화상을 짚는다.
이 교수는 “AI는 도구일 뿐이며, 그것의 활용 여부에 따라 시민사회는 강화되거나 훼손될 수 있다”며 “생성형 AI 시대에 요구되는 것은 기술의 숙련 외에 기술을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사회적 윤리를 함께 사유할 수 있는 시민 리터러시”라고 강조했다.
특히 방송 현장에서의 실질적 적용에 관한 논의가 눈에 띈다. 이경락 YTN 저널리즘연구소장은 뉴스 생산 과정에서 생성형 AI 활용 사례와 저널리즘적 쟁점을 제시했으며, KBS 공영미디어연구소장을 역임한 유건식 PD는 드라마, 예능, 공연 등 제작 현장에서 마주한 기술적 문제와 윤리적 갈등을 설명했다. 이서현 제주대 언론홍보학과 교수는 조직 내 방송 제작자들의 반응과 수용 태도를 중심으로 현장 적용의 실질적 문제를 들여다봤다.
생성형 AI 기술이 시민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교육과 정책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창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터러시 교육과 정책적 접근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시민성 함양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했다. 김위근 퍼블리시 최고연구책임자는 윤리적 논의와 현실적 대안을 중심으로 생성형 AI의 바람직한 활용 방향을 제시했다.
총서를 기획한 이종명 선임연구원은 “이번 총서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미디어 종사자와 시민 모두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고, 기술 중심의 담론에서 벗어나, 시민의 삶을 중심에 두는 ‘사람 중심의 AI 활용’ 논의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2
0 / 300
-
mac**** 2025-07-16 17:37:02양반 성대 다음 Royal대 예우. 상위규범인 국제법,한국사, 헌법, 세계사,주권기준이라 변하지 않음. 5,000만 한국인 뒤, 주권.자격.학벌없이, 성씨없는 일본 점쇠(요시히토,히로히토등)가 세운, 마당쇠.개똥이 경성제대 후신 서울대. 그뒤 서울대 미만 전국 각지역 대학들. https://blog.naver.com/macmaca/223894018066
-
mac**** 2025-07-16 17:36:26필자가 일본 잔재학교 서울대등 질타 이유는,포츠담선언(카이로선언 포함)받아들여,한국.대만.동남아,쿠릴열도등에 일본 주권없고 축출해야한다는 국가원수들 합의문때문.그리고 한국 임시정부는 한일병합무효,대일선전포고.*한국에 주권없이 남겨진 패전국 일본잔재 경성제대후신 서울대와 초급대출신 국립대,중.고교등은 축출(폐지)대상@한국 국사교육은 대학분야 유일무이 최고 교육기관 성균관(해방후 성균관대), 고등학교 교육은 향교.서원이외에 국사 교과서로 교육시킬 신생 학교들이 없음. 국사 성균관자격 宮성균관대.서강대는 예수회의 가톨릭계 귀족대학으로
추천 기사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