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당선인측 관계자는 31일 "공기업 사장, 공공기관장, 공기업 감사 등은 전문성과 업무경험이 필요하다는 게 박 당선인의 기본 생각"이라며 "기존의 낙하산 인사 교체는 물론, 정치권 출신들이 무분별하게 공공부문에 진입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당선인은 전날 정무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낙하산 인사가 새 정부에서는 없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선 직후인 지난해 12월 25일에는 "최근에 공기업·공공기관 이런 곳에 전문성 없는 인사들을 낙하산으로 선임해서 보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리고 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당선인의 이 같은 방침으로 과거 정부에서 최측근 인사나 여당의 총선 낙천자 등 공신들이 대거 진출했던 28개 공기업 임원·감사 자리와 지식경제부 산하 60여개 공공기관 임원직이 사실상 사라지게 됐다.
역대 정부의 경우 학연·지연 등으로 웬만한 공기업·공공기관 임원 자리는 싹쓸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에서는 정권 출점 초부터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출신), '영포 라인'(경북 영일·포항 출신) 같은 말이 나돌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여권 곳곳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원칙은 맞다"면서도 "우리 같은 현역(의원)은 괜찮은데 대선 때 열심히 뛰었던 측근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여권의 한 관계자도 "정치권 출신 중에서도 리더십이나 해당분야에 전문성을 지닌 인사들도 많다"며 "박근혜 정부와 관계가 있다고 공기업 진출 자체를 막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회 입성이나 재진입을 노리는 친박인사들은 스스로 낮은 자세를 보이고 있다. 실제 김무성 전 새누리당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선 직후 스스로 모습을 감추기도 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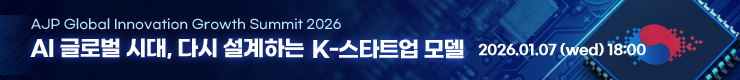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