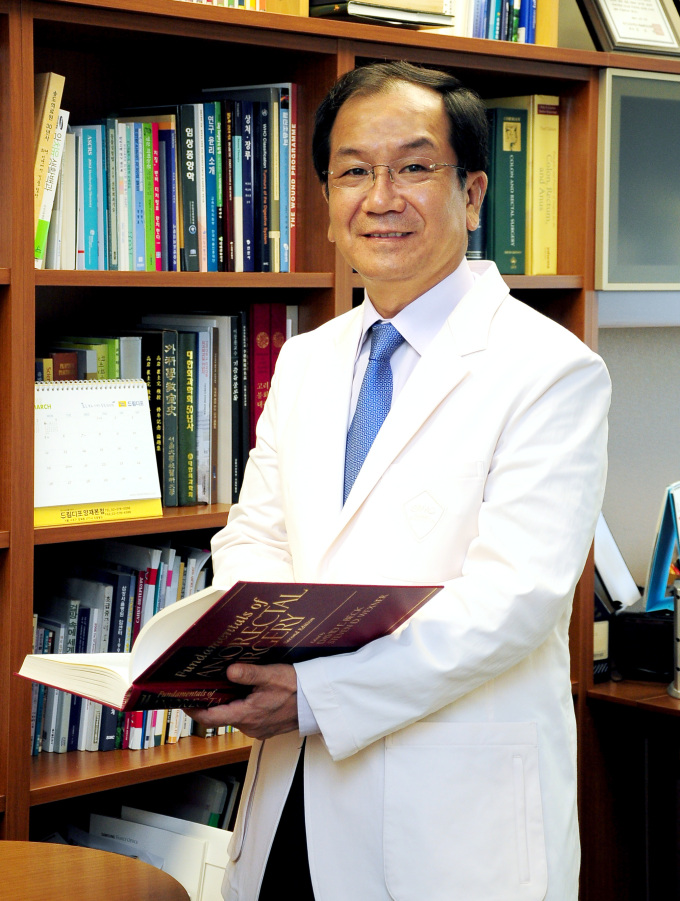 |
| 전호경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 |
전호경 강북삼성병원 외과교수는 3일 “외과는 새로운 전공의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이미 자격을 갖춘 전문의들도 피부과 성형외과 등 비보험 진료가 가능한 과로 과목을 바꿔 개업하는 등 안타까운 상황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전 교수는 “이는 정부의 저수가 정책과 각종 규제로 인해 본인의 노동이 적절한 평가와 대가를 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의사들이 많기 때문”이라며 “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전공의 수급은 잠시 잠깐의 효과는 있을지 모르나, 이미 전문의가 된 외과 의사들의 현장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외과는 의술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학문 분야로 특히 노령화되면서 늘어나고 있는 암치료에 있어서는 수술만이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유일한 치료 방법인 경우가 많다”며 안타까워했다.
이에 따라 전 교수는 “보조금의 지급을 통한 전공의 수급은 잠시 잠깐의 효과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호경 강북삼성병원 외과교수는 대장암 시술분야 명의(名醫)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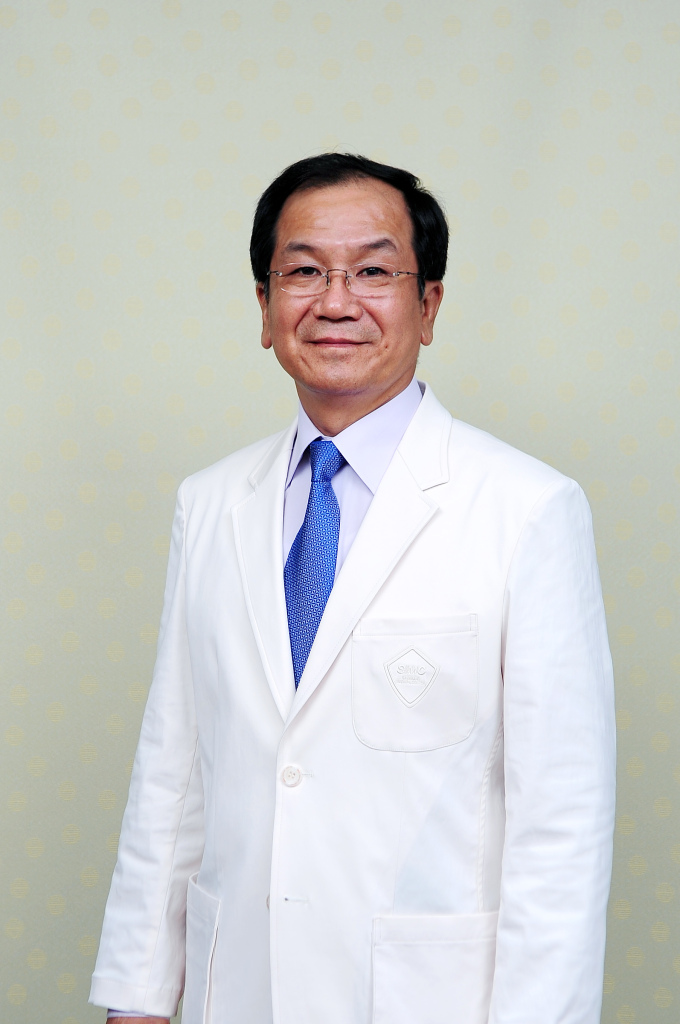 |
| 전호경 강북삼성병원 외과 교수 |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전 교수는 삼성서울병원 소화기외과 과장, 소화기센터 소장, 암센터 대장암센터장, 건강의학센터장 등 병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또 성균관의대 외과학교실 주임교수, 대한대장항문학회 이사장을 지냈으며 지난해 4월에는 대한대장항문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재임 시 삼성암센터 대장암센터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으며, 삼성창원병원과의 진료협력 시스템 구축에 참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전 교수는 1994년 삼성서울병원에서 진료를 시작한 이래 지난해 10월 강북삼성병원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까지 6000명에 가까운 대장암 환자를 수술했다.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1300명 가량의 환자를 복강경으로 수술했다.
특히 복강경의 한 방법인 수부보조복강경 수술에 대해 가장 경험이 많고 국내에 이를 활성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모스크바에서는 수술실에서 실제 실습을 시행하기도 했다.
수부보조복강경 수술은 자른 대장을 꺼내기 위한 6cm 가량의 작은 절개창으로 한 손을 넣어 수술하는 방법이다.
손의 촉감과 섬세한 관절 운동이 살아 있기 때문에 순수 복강경수술로는 안전하게 진행하기 힘들어 개복이 필요한 환자도 복강경으로 수술을 마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초기 대장암에서 항문 보존률을 높일 수 있는 항문을 통한 국소절제(경항문 내시경 미세수술)를 국내에서 가장 많이, 또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 여러 학회에서 특별 강연을 시행하면서 주목받았다.
대장암의 증상은 암이 생긴 위치와 암의 종류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오른쪽 결장(맹장·상행결장)에 생기는 종양은 왼쪽 결장에 비해 오른쪽 결장이 굵고, 오른쪽 결장의 대변이 왼쪽 결장에 비해 묽기 때문에 장폐색을 일으키는 일이 별로 없다.
대신 오른쪽 결장에 발생하는 병변은 대개 만성적인 출혈을 유발하고 그 결과 빈혈을 일으킨다.
반면 왼쪽결장(하행결장·에스결장)에 생기는 병변은 흔히 장폐색 증상을 일으키며, 환자들은 변이 ‘가늘어졌다, 변을 보기가 힘들다, 변을 보려 할 때마다 배가 아프다’ 등 배변 습관에 변화가 생겼다고 호소하게 된다.
그러나 대장암이 출혈을 동반하지 않거나 폐색을 일으킬 만큼 충분히 크지 않은 경우 전혀 증상이 없는 경우도 흔하다.
전 교수는 “증상을 동반한 대장암의 경우 크기가 크고 비교적 진행된 병기인 경우가 많으므로, 무증상 대장암을 발견하여 조기에 치료하기 위한 건강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장암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으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암의 약 10%를 차지하며, 우리나라에서도 그 발병과 사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의 2009년 통계에 따르면 대장암은 남자에서 둘째, 여자에서 셋째로 많이 발생하는 암이며, 국제암연구소는 ‘세계 대장암 발병현황’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남성의 대장암 발생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고 세계적으로도 4위에 해당한다.
이는 계속해서 증가해 2030년에는 지금의 두 배까지 발생률이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