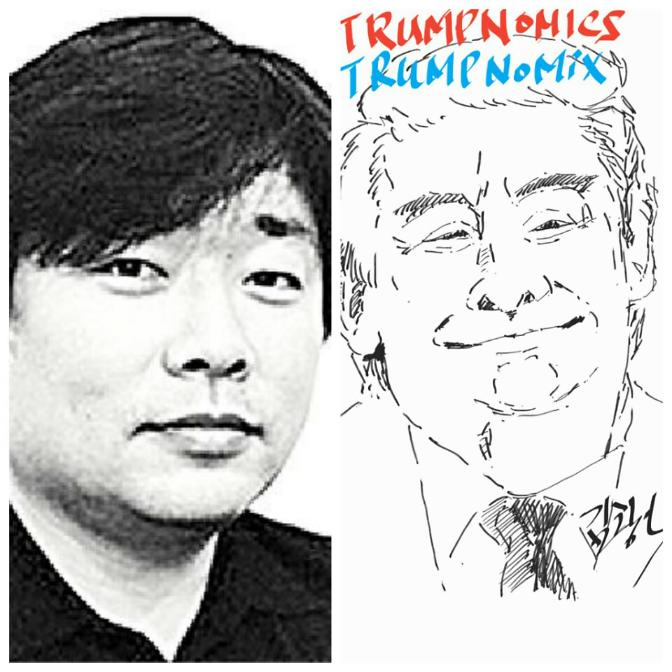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정책, ‘트럼프노믹스(Trumpnomics)’는 '잡탕정책(Mixed Policy)'이란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의 공약을 보면 기업감세와 인프라투자, 보호무역과 강달러 등 서로 상충하는 경제정책의 보따리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법인세 15% 감면과 1조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과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옐런의 저금리 비난 등이다.
그래서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트럼프노믹스가 레이거노믹스와 오바마노믹스, 케인즈주의 사이에서 태어난 사생아란 원색적 비난도 나온다.
경제학적 프레임에서 보면 이같은 비판이 크게 틀리지 않는다. 경제현상은 여러 가지 원인이 혼합된 결과지만 한가지 경제정책은 대부분 한가지 결과로 귀결된다. 따라서 트럼프가 언급한 하나하나의 경제정책이 서로 다른 하나하나의 결과로 이어질 것을 예측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방향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트럼프노믹스를 비판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상아탑의 프레임에서 벗어나면 결과는 상당히 달라진다. 트럼프는 성공한 사업가이지 경제학자가 아니다. 사업가는 이윤추구라는 한가지 목적에 집착한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업가의 행동양식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다.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의 한가지 목적은 강대한 미국을 재건하는 것이다. '미국 우선주의'를 뜻하는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란 구호에 잘 나타나 있다.
트럼프의 정책과 행동은 이 한가지 목표란 프레임에서 보면 해석이 쉽다.
법인세 15% 감면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기 위한 전략이다. 2조달러에 달하는 해외이익이 미국으로 유입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1조달러 인프라 투자는 막대한 토목공사로 수요를 자극하려는 전통적인 뉴딜정책이다. 모두 미국의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전략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지난 100년간 유지돼 온 ‘중국생산-미국소비’란 세계 경제구조의 틀을 파괴하겠다는 것이다. 기축통화 달러의 힘을 업고 미국이 '메이드-인-차이나(Made-in-China)'를 사주면서 세계경제는 급속도로 성장했지지만 '무역-재정' 적자란 쌍둥이 적자가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쌍둥이 적자는 달러의 신뢰성을 훼손하고 결국 기축통화 자리를 위협한다. 이 고리를 끊기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택한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강한 달러와 맥이 닿아 있다.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려는 것은 트럼프식 보호무역주의의 완결판이라고 할 수 있다. 부시 미국 행정부 시절엔 후진타오 중국 정부에 40%에 달하는 위앤화 절상을 요구했다. 후진타오는 "장기적 검토"란 완곡한 수사로 부시의 압박을 견뎌냈지만 시진핑 정부에 와서는 상황이 달라졌다. 달러의 문제는 미국의 문제라며 맞짱을 뜬다. 파트너가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뀐 것도 시진핑이 배짱을 튕기는 데 한 몫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상대는 트럼프다. 그리고 트럼프는 위앤화절상을 포기하고, 환율조작국 카드를 꺼냈다. 위앤화 절상 효과를 낼 수 있을 만큼, 즉 40%에 육박하는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책들은 '강한 미국-강한 달러'란 목적에 모두 부합한다. 물론 정책들간의 상충이 효과를 반감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 것은 선후관계를 정리하고 타이밍을 세밀하게 맞추는 등 정책운영의 묘에 따라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학문적 프레임을 살짝 벗어나면 트럼프노믹스는 아메리카 퍼스트란 하나의 뚜렷한 목적으로 귀결된다.
트럼프노믹스가 잡탕(Mix)이란 비판에 대해 트럼프는 이렇게 말할 것 같다. “Mynomics is No Mix.” 즉, "내 정책은 잡탕이 아니야"라고.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