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세를 보이던 엔화가 이번 사태로 약세로 돌아서면, 우리나라 수출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불거지고 있지만 '단기 충격'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200%가 넘는 재정적자에도 전문가들이 신용등급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일본 정부가 발행한 국채의 90%를 기관투자자 등 자국민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들의 채권 보유 비중이 크면 신용평가 하락 등 위기 발생시, 이들이 채권을 매도하고 빠져나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일본은 외국인 채권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안전할 것이라는 평가다. 일본 채권의 90% 이상을 국내 채권자들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로 빼갈 우려는 없기 때문이다.
허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팀장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올 초 일본 대지진에 이어 이번 신용등급 강등에도 엔화는 계속 강세를 보여왔다"며 "위기 발생시 외국인들이 일본에 있는 주식이나 금융상품을 팔고 나가는 힘보다 자국민들이 외국에서 팔고 오는 힘이 더 큰 나라가 바로 일본"이라고 평가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도 지난 4월 대지진 이후 일본의 국가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한 바 있다.
당시 S&P는 도호쿠 대지진과 이로 인한 쓰나미, 후쿠시마 원전 사태 등으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엔화는 단기 충격으로 약세를 보였지만, 주요 20개국(G20)이 나서면서 결국 강세로 반전했다.
게다가 미국이 여전히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엔화 강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유익선 우리리서치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이번 신용등급 강등은 우리 증시에 불안심리를 조장하는 요인으로 작용,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면서도 "장기전으로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신용등급 하락에도 엔화는 여전히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일본의 해외 투자자금이 과연 언제까지 다시 돌아와 줄 것인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국내 증권사의 한 애널리스트는 "일본 대지진 당시 엔화의 방향성은 여전히 엔화가 안전자산이라는 것을 보여줬다"며 "하지만 대외 충격이 계속해서 발생하면 언젠가는 내성이 깨질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일본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누적됐다는 점이 이번에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라고 덧붙였다.
이번 신용등급 강등의 또 다른 원인으로 일본 정치권의 리더십 부재를 꼽는 목소리도 있다.
허 팀장은 "일본은 1년간 수상이 5번이나 바뀌는 등 도호쿠 지진 복구 과정에서 정치적 리더십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며 "신평사들이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평가할 때 경제적인 측면 뿐만아니라 정치적인 리스크도 본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연 일본이 수많은 재정적자를 갚을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지난 5년간 지켜봤는데 '아니다'쪽으로 기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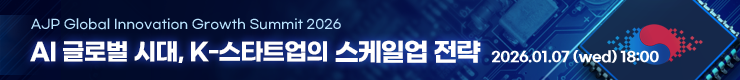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