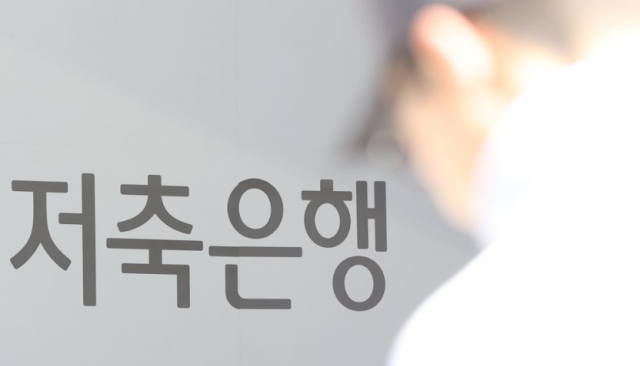
17일 저축은행 업계에 따르면 중앙회는 1조3000억원 규모 저축은행업권 NPL을 운용할 수 있는 자회사를 이르면 올해 상반기 설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회사 자본금은 1000억원 규모로 전망된다.
저축은행 업계가 NPL전문투자회사(NPL투자사)를 설립하려는 이유는 업계 부실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분기 저축은행 연체율은 8.73%로 전 분기(8.36%) 대비 0.3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부동산 PF 여파로 국내 저축은행 중 절반가량(79곳 중 36곳)의 연체율이 지난해 3분기 기준 10%를 웃돌고 있다. NPL이 쏟아져 나오는 현시점에서 저축은행 업계 부실 PF사업장 매각 또한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저축은행업계는 NPL을 NPL투자사에 넘겨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그리 녹록지는 않을 전망이다.
먼저 출자 방식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NPL투자사를 만드는 데 가장 많은 자금을 대는 곳은 대형 저축은행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대형 저축은행들은 중소형 저축은행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NPL 매각이 급하지 않아 회사 설립에 소극적일 가능성이 있다. 대형 저축은행들은 연체율을 상대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으며, NPL 매각 루트가 따로 마련돼 있는 곳도 있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NPL투자사가 설립되더라도 업계 건전성이 단기간에 개선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큰 2금융권 NPL은 NPL시장에서 인기가 높지 않다. 기존 NPL투자사들은 일반적으로 담보가 있는 1금융권 채권을 선호하기에 후순위거나 담보가 없는 2금융권 채권은 매각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NPL투자사가 설립되더라도 경쟁력이 떨어져 시장에 매각하기 힘든 채권을 무조건적으로 사들일 수는 없다.
지난해 한국은행이 내놓은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를 보면 NPL투자사는 2023년 채권을 5조2000억원어치 매입했는데 이는 대부분 은행권 선순위 우량담보부 대출채권이었다. 당시 한국은행은 “NPL투자사는 은행권 담보부 채권을 선호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저축은행 업계에서는 NPL 판매 채널을 하나라도 늘리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NPL시장에서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매각처가 하나라도 더 있는 것이 저축은행 입장에서는 더 낫다"며 "NPL투자사가 빠르게 설립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