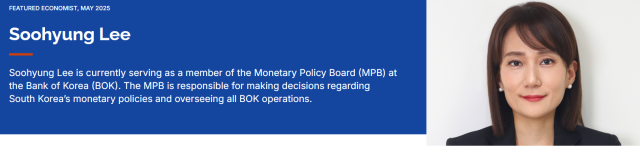
[사진=IEA 홈페이지]
이수형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이 우리나라의 자본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되는 현상이 집값을 끌어올리고 소비를 제약하면서 결국 출산율이 감소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일 국제경제협회(IEA)에 따르면 이 위원은 최근 IEA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서 과도한 부동산 집중 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집중 현상은 금리 인하기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며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경제에서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여 주택 비용 상승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자금을 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른 형태의 소비를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층은 주택시장에 더욱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2월 인구동향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은 0.82명이며 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를 뜻하는 조(粗)혼인율은 4.4건에 불과하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은 미국과 달리 부동산 외 다른 투자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한국 금융시장이 미성숙함에 따라 주택시장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 500)과 달리 한국의 주가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투자는 물론 저축 수익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장기 투자가 가계 자산을 축적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며 "이는 곧 미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금융 자산이고 나머지 30%가 부동산인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 나머지 30%만 금융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게다가 고소득층의 부동산 비중이 저소득층보다 높은데 미국에서 관찰되는 패턴과는 정반대"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위원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에서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근본적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4월 한은 금통위원으로 합류해 최근 임기 1주년을 맞았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학자로 미 스탠퍼드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릴랜드대학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이 위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데이터에 기반한 노동경제학이다. 주택 공급 정책, 외국인 투자자의 분포,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으며 금통위원이 된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통화정책과 연관해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에서 이 위원은 공직 경험에 기반한 최신 연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의 장거리 통근에 대한 연구인데,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벌어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왕복 약 4시간이 걸리는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평일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허리와 근육 통증, 수면 부족, 일과 삶의 균형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우려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거리 통근자 비율(하루 2시간 이상 통근하는 근로자)이 1% 증가할 때마다 병원 방문 근로자 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는 각각 3.5%, 9.1% 늘어났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많은 정책 결정이 충분한 과학적 평가 없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20일 국제경제협회(IEA)에 따르면 이 위원은 최근 IEA와 인터뷰에서 "한국 경제에서 과도한 부동산 집중 현상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집중 현상은 금리 인하기 주택 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지며 통화정책을 제약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와 관련해 집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은 경제에서 더 많은 자원을 끌어들여 주택 비용 상승을 더욱 심화시킨다"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택 구매 자금을 부채에 의존하게 되고 이는 다른 형태의 소비를 제약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젊은 층은 주택시장에 더욱 소외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혼인율과 출산율이 감소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자본이 부동산에 집중되는 현상은 미국과 달리 부동산 외 다른 투자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한 원인이라고 짚었다.
이 위원은 "한국 금융시장이 미성숙함에 따라 주택시장과 유사하거나 더 나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투자 수단이 충분하지 않다"며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 500)과 달리 한국의 주가지수는 중장기적으로 주택 투자는 물론 저축 수익률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에서는 시장 지수를 추종하는 ETF의 장기 투자가 가계 자산을 축적하는 안전한 방법으로 여겨진다"며 "이는 곧 미국 가계 자산의 약 70%가 금융 자산이고 나머지 30%가 부동산인 이유"라고 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엔 "가계 자산의 70%가 부동산, 나머지 30%만 금융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다"며 "게다가 고소득층의 부동산 비중이 저소득층보다 높은데 미국에서 관찰되는 패턴과는 정반대"라고 비교하기도 했다.
그는 향후에도 한국 경제의 부동산 쏠림 현상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 위원은 "미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 경제에서 자산이 부동산에 과도하게 집중된 근본적인 요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은 지난해 4월 한은 금통위원으로 합류해 최근 임기 1주년을 맞았다.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한 기획재정부 출신의 경제학자로 미 스탠퍼드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메릴랜드대학교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를 거쳐 2020년부터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로 일했다.
이 위원의 주요 연구 분야는 데이터에 기반한 노동경제학이다. 주택 공급 정책, 외국인 투자자의 분포, 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 부동산에 대한 연구를 주로 해왔으며 금통위원이 된 이후에도 관련 연구를 통화정책과 연관해 이어오고 있다.
인터뷰에서 이 위원은 공직 경험에 기반한 최신 연구를 소개하기도 했다. 한국의 장거리 통근에 대한 연구인데, 행정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으로 옮기면서 벌어진 문제점을 짚었다.
그는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왕복 약 4시간이 걸리는 매일 출퇴근을 하거나, 평일에는 가족과 떨어져 생활한다"며 "많은 사람들이 허리와 근육 통증, 수면 부족, 일과 삶의 균형 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한다"고 우려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장거리 통근자 비율(하루 2시간 이상 통근하는 근로자)이 1% 증가할 때마다 병원 방문 근로자 수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의료비는 각각 3.5%, 9.1% 늘어났다. 이 위원은 "한국에서 많은 정책 결정이 충분한 과학적 평가 없이 이뤄진다"고 비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