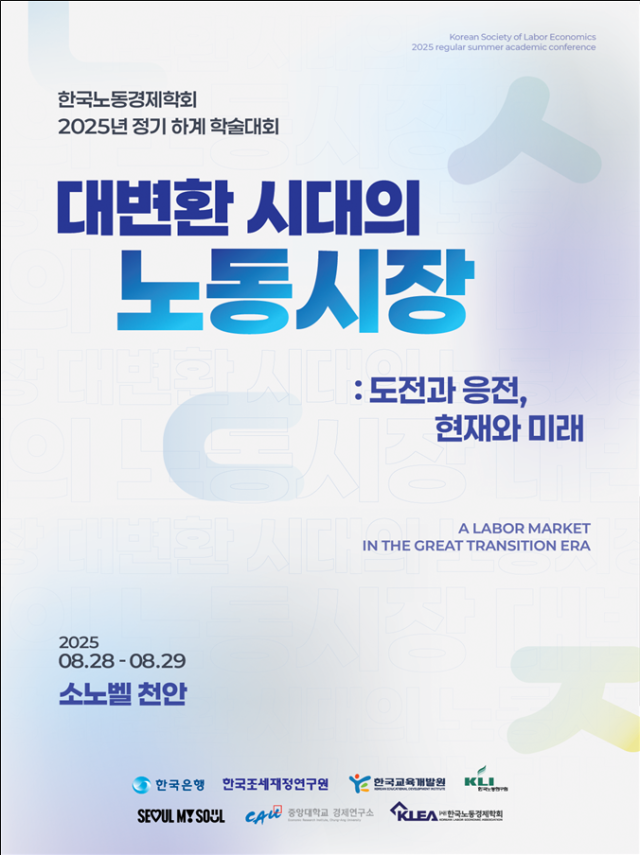
서울시가 추진 중인 '디딤돌소득'이 제도화를 향한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28일 한국노동경제학회 하계 학술대회 특별세션을 통해 지난 3년간 디딤돌소득 시범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전국 확산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세션은 '근로 연령층의 근로 유인 제고를 위한 소득보장제도의 모색'을 주제로 열리며, 100여 명의 학계·연구기관 전문가들이 참석한다.
서울시는 27일 현장 효과와 학문적 검증을 병행해 디딤돌소득을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 설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전 대표가 주장한 보편적 기본소득은 전 국민에게 연 100만 원씩만 지급해도 매년 50조 원이 넘게 소요되며, 장기적으로는 10년간 1300조 원(1000조 원대) 이상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 재정을 사실상 파탄낼 수 있는 구조다.
반면 서울시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부족한 소득분만 보전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로, 재정 투입은 훨씬 적으면서도 정책 효과는 분명하다.
서울시는 지난 3년간 2076가구에 디딤돌소득을 지급했고, 이 가운데 일부 가구는 근로소득이 늘어나면서 제도 밖으로 탈수급에 성공했다. 이는 단순 현금 살포가 아닌, 근로 의욕과 자립을 끌어내는 제도임을 입증한 것이다.
28일 특별세션에서 이정민 서울대 교수는 '부의 소득세가 노동시장과 건강결과에 미친 영향'을 발표하며, 디딤돌소득이 소득 불평등 완화와 정신건강 개선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 김평식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박사는 "급성질환과 같은 돌발 상황에서 소득이 급감하는 근로자에게 디딤돌소득이 실질적 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토론자들은 "디딤돌소득은 단순한 복지 제도가 아니라 고용 촉진형 소득보장제도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며 제도화를 위한 지속적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론회에서 도출된 의견을 토대로, 향후 디딤돌소득의 제도화 및 전국 확산을 추진할 계획이다.
윤종장 서울시 복지실장은 "정책이 성공하려면 현장의 실효성과 학문적 검증이 병행돼야 한다"며 "미래형 소득보장제도로서 디딤돌소득을 견고히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그럴듯해 보이지만, 막대한 재정 부담과 근로의욕 저하라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다. 반면 디딤돌소득은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면서도 근로를 유인하는 제도로,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번 학술토론은 오세훈 시장의 디딤돌소득이 천조 원짜리 공약을 넘어 현실적 대안임을 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