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간 30주년을 기념하고 저자인 홍세화의 타계 1주기를 기억하는 의미를 담아 개정증보판으로 나왔다. 1979년 유신 말기, 반독재 투쟁을 전개해 온 남민전의 조직원들은 ‘빨갱이’로 몰려 대거 체포됐다. 당시 우연찮게 빠리에서 생활하고 있었던 남민전 일원인 저자는 하루아침에 망명자 신분이 됐다. 그는 생존을 위해 택시운전사로 일하는 길을 택했다. 빠리의 유일한 한국인 택시운전사로 일하며 한국 사회에도 프랑스 사회에도 온전히 속할 수 없는 이방인으로서 겪고 고민한 바를 써 내려갔다.
저자는 한국과 프랑스 사회의 차이는 ‘똘레랑스’의 유무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한다. 그는 당신의 이념과 신념이 존중하길 바란다면 남의 이념과 신념도 존중하는 ‘똘레랑스’가 있는 프랑스 사회에서는 타인의 생각을 막무가내로 비난하거나 강제로 바꾸려 들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한반도를 지배한 ‘증오의 이데올로기’는 인간 사이의 신뢰와 연대, 상호 책임을 훼손하고 공동체를 찢어놓았다고 진단했다. 저자는 2006년 개정판의 서문에서 ‘달라졌으면서 달라진 게 없는 세상이라서 똘레랑스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것은 앞으로도 아주 긴 세월 동안 계속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증보판에는 저자의 오랜 벗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의 추도문과 저자가 2023년 <한겨레신문>에 마지막으로 기고한 칼럼을 추가했다.
“똘레랑스가 있는 사회에선, 즉 설득하는 사회에선 남을 미워하지 않으며 축출하지 않으며 깔보지 않았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지 않고 대신 까페에서 열심히 떠들었다. 말이 많고 말의 수사법을 중요시했다. 또 강요가 통하지 않으므로 편견이 설 자리가 없었다. 택시운전사를 택시운전사로, 즉 그대로 인정했다. 이 말은 택시운전사인 내가 택시운전을 잘못할 때는 손님의 지청구를 들을 수 있으나 택시운전사라는 이유 때문에 업신여김을 당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아듀! 고물택시’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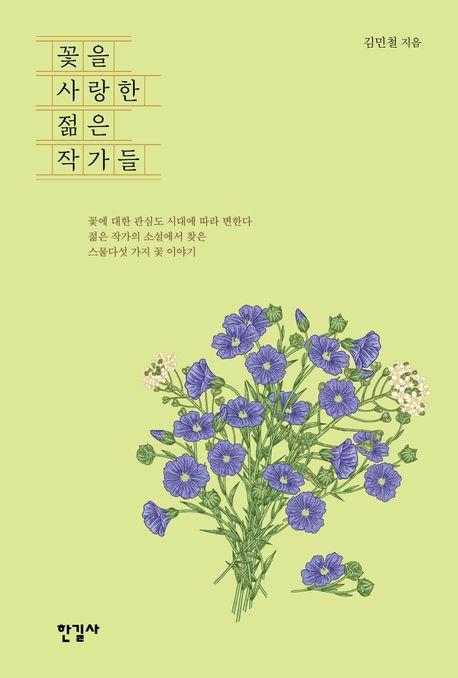
무심코 넘긴 소설 속 꽃 한 송이에 작가들이 어떤 의미를 담았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재미가 있다. 저자는 작품 속 꽃을 나열하거나 단순한 문학 해설에 그치지 않고, 꽃과 나무를 매개로 문학을 새롭게 바라보는 안내서를 제시한다. 식물애호가는 소설에 등장하는 꽃을 통해 문학의 깊이를 느끼고, 문학을 사랑하는 독자에게는 익숙한 작품 속 무심코 지나쳤던 식물에서 아름다움과 상징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저자가 전국은 물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수집한 풍부한 사진 자료도 볼 수 있다.
"'내가 나무라면 라일락이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곳도 있다. 김장우가 야생화라면 나영규는 라일락에 가깝지 않을까 생각해보았다. 주인공이 엄마가 아닌 이모의 삶을 부러워했다는 점에서 두 남자 중 누구를 택할지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7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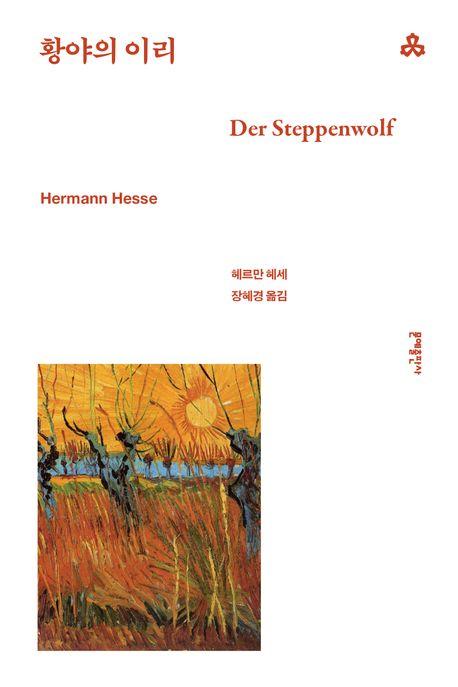
황야의 이리=헤르만 헤세 지음. 장혜경 옮김. 문예출판사.
이 책에는 인간 존재의 고독과 자아의 이중성,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 저자인 헤르만 헤세와 소설 속 주인공인 하리 할러의 이니셜이 같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 헤세의 그 어떤 소설보다도 자전적이다.
주인공은 중년의 남성이다. 그는 문명화된 존재인 동시에 사회성을 거부하는 야만성을 가진 ‘황야의 이리’다. 인간과 이리라는 두 가지 본성을 가졌다고 여기는 그의 내적 분열은 깊은 고독과 자아 상실로 이어진다. 저자의 대표작인 <데미안>과 다른 점은 주인공이 이제 막 성장하는 청소년이나 젊은이가 아니라 긴 세월 동안 삶의 모순에 괴로워하며 지쳐버린 중년의 사내라는 사실이다. 끊임없이 자살을 생각하는 이 사내는 <데미안>을 발표하고 1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고통스러운 경험을 하며 지쳐버린 헤세의 자화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짜 시민은 유머를 이해할 수 없지만 유머는 항상 어쩐지 시민적이다. 모든 황야의 이리가 꿈꾸는 복잡다단한 이상은 유머의 상상 공간에서 실현된다. 그곳에서는 성자와 탕자를 동시에 긍정하고 이 양극단을 휘어 붙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 계급마저도 긍정의 대열로 끌어들일 수 있다.” (72쪽)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