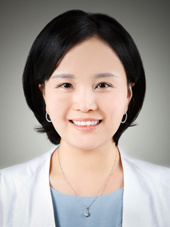 |
| 정치부 이정은 기자 |
이를 테면 '혁신'이나 '쇄신'은 무소속 안철수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의 교집합에 속해 있고, '통합'과 '미래'는 안 후보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공통분모인 식이다.
모두가 저마다의 미래와 쇄신을 부르짖고, 각자의 뜻을 담은 경제민주화에 대해 논하고 있다. 이는 제대로 된 실체, 즉 '정책'이 없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안 후보의 늦은 출마선언으로 인해 3각구도가 늦게 형성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정책경쟁이 쉽사리 이뤄질 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야권 후보들의 경우, 앞으로 두 달여 남은 후보등록일까지는 단일화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여겨지는데도 각 후보의 이름이 떠오를 만한 제대로 된 공약 하나 없다.
심지어 지지층까지 겹쳐 각자의 색깔을 더 드러내야 하는 상황. 그러나 이 같은 상황에서도 후보들은 유권자들의 의견을 더 듣겠다며 스킨십만 강화하고 있다.
이대로 가다간 제대로 된 정책선거가 아니라 결국 시간에 쫓겨 '이미지 선거'로 흐를 공산이 크다.
최근 안 후보 캠프의 핵심 관계자는 주요 정책이나 공약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다른 당도 내놓지 않았다. 말만 무성할 뿐"이라고 답했다.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현재 대선을 앞둔 미국에서는 각 후보가 내세우는 바와 색깔이 명확하다.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1200만개 일자리 창출방안을 내놓았고, 재선을 노리는 오바마 대통령은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추방조치를 중단하겠다고 했다. 유권자들은 자신과 밀접한 공약과 정책을 내놓는 후보에게 쉽게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우리는 '빈 수레'이기 때문에 요란한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때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선 이들이 정책이라는 실체도 없이 구호만 새로워서는 안 될 일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